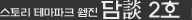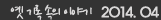선비들의 봄 소풍,
자연과 인위가 만나 인문을 꽃피우다
‘그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니, 나라의 각 고을에서는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들어 서로 따르며 노래하고 논다.’ 중국 정사(正史) <삼국지>에 기록된 고구려 풍속이다. 요즘의 이른바 ‘불타는 금요일’, 즉 불금의 대도시 클럽 풍경을 떠올려 봄직도 하다. 금요일 밤 클럽 풍경이야 서울, 도쿄, 뉴욕 등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춤추고 노래하며 노는 문화의 유전자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까 추측케 만드는 기록이다.
고려 시대 축제인 팔관회나 연등회 풍경은 또 어떠하였던가. 국가적·종교적 성격을 모두 지닌 행사였지만 남녀노소가 모여 다양한 놀이와 공연을 즐기며 어울렸으니 가히 ‘범(凡)국가적 불금’이었다. 그 축제 기간 고려의 많은 남녀들이 ‘썸씽’을 꽃피웠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얼마나 놀고 있을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OECD 34개국 중 멕시코(2317시간)와 칠레(2102시간) 다음으로 세 번째(2092시간)다. 근면하기로 소문난 독일과 일본도 1317시간과 1765시간이다. 일만 해서도 놀기만 해서도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일과 놀이가 조화를 이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웰빙(well-being), 잘 살기는 웰워킹(well-working)과 웰플레잉(well-playing), 즉 잘 일하기와 잘 놀기의 조화다.
동양사상에서 일과 놀이는 예악(禮樂) 개념과 상응한다. 기업 이사들의 의자와 말단 직원의 의자는 다르다.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연봉만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예(禮)다. 반면 회식 2차 노래방에서 머리에 넥타이 질끈 동여매고 이사와 말단 직원 할 것 없이 하나로 어울려 노는 것, 그렇게 하나로 합하는 것이 악(樂)이다. 예는 분(分)의 기술이고 악은 합(合)의 기술이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예와 악, 일과 놀이, 분과 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잘 된다는 것이 동양사상, 특히 유교(儒敎)의 관점이다.
악, 요즘으로 말하면 넓은 의미의 엔터테인먼트가 합의 기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대구의 선비 서찬규(徐贊奎 1825∼1905)의 <임재일기>(臨齋日記)에 따르면 그는 1846년 9월 16일, 집에 들였던 창부(倡夫)들을 내보냈다. 반년이나 서로 의지했던 터라 마음이 허전하고 착잡했다. 창부 일행도 마찬가지였다. 일행은 짐을 꾸렸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어디로 가서 입에 풀칠해야 하나. 하늘도 무심하게 날씨는 쨍하니 맑기만 해서 발길을 재촉하는 것 같다.
서찬규는 2월 21일 생원과에 합격하고 서울에 머무를 때 처음 그들을 만났다. 창부(唱夫) 조신성, 재인(才人) 강계술, 무동(舞童) 엄달운 등으로 모두 실력이 출중했다. 그들은 서찬규를 따라 서울에서 대구로 왔다. 대과(大科)를 준비해야 되는 때 남의 이목이 염려되고 가솔이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까지 있어 4월 28일에 잠시 창부들을 내보내기도 했지만, 6월 2일 창부들이 다시 찾아와 의탁하길 청하기에 집으로 다시 들였다. 그들은 서찬규가 지은 시를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서찬규가 산에 오를 때 함께 올라 흥을 돋워주기도 했다.
엄격한 신분 사회인 조선에서 생원과에 합격한 선비 서찬규와 미천한 창부 일행의 넘을 수 없는 신분 차이는 분명했다. 신분 질서가 많이 어지러워진 19세기 중반이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반상(班常)을 구분하는 법도는 엄연했던 데다가 창부들은 상민(常民)에도 못 미치는 천인(賤人)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그들은 악(樂)에서 서로 통했고 흥(興)에서 공감해마지 않았으니 놀이란 바로 그렇게 합하여 주는 것이다.
한편 선비들의 봄 소풍, 즉 봄놀이가 문(文)과 질(質)이 조화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자연(自然)과 인위(人爲)라는 두 범주가 융합되는 일종의 인문(人文) 활동이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권성구(權聖矩 1642~1708)의 <유청량산록(遊淸凉山錄)>에 기록되어 있다. 권성구는 1706년 4월 5일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군의 강림대(江臨臺) 근처에서 배를 타고 소풍했다.
‘나는 병인년에 망선암(望仙庵)에서 연대사로 향했을 때 물결을 따라 내려갔다. 맑은 연못은 깊었으며 십 리에 걸쳐 한결같이 푸르고 굽이굽이마다 아름다웠다. 항상 다시 가고 싶어 했는데 훌쩍 이십 년이 흘러간 뒤에야 이 길을 지나게 되었다. 깊었던 연못은 바람과 모래흙만 아득했고 숨겨져 보이지 않던 돌은 드러나 메말랐다. 자연의 변화가 이러한데 하물며 세상의 도리는 얼마나 변하였겠는가?’
권성구가 말에서 내려 잠시 쉬다가 권화원과 만나 물가에 도착하니 김진세, 김성경, 남경천 등 여포(餘浦, 현 봉화군 명호면 풍호2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술을 몇 번 돌리고 몇 명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며 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일행은 서로 화답하며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는데 권성구는 오언 근체시를 지어 불렀다.
여름 숲 맑은 그늘 변해갈 때 / 푸른 물에 배 띄워 노를 젓네
봉우리 돌아갈 젠 이내 낀 숲 기우는 듯 / 햇빛은 비단 물결을 비추누나
막걸리 한 잔에 호기가 드러나고 / 미친 듯 노래하니 노인의 흥 다하누나
알겠노라 속세의 바깥에 / 별도의 한 강물이 있음을
본래 그대로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이라면, 공 들여 노력하고 공교(工巧)하게 꾸미는 것이 인위다.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自然) 것이지만 그것을 사람이 감상함으로써 ‘사람이 노력하고 꾸미는 것’(人爲)의 범주에 들게 된다. 권성구는 ‘자연의 변화가 이러한데 하물며 세상의 도리는 얼마나 변하였겠는가?’라고 말하며 자연의 변화와 인간 세상의 도리, 즉 자연과 인위를 상응시킨다.
자연 쪽에 치우치면 도가(道家)로 기울고 인위 쪽에 편중되면 법가(法家)로 귀착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웃옷 단추를 가장 위의 것까지 모두 끼우면 법가, 둘 이상 풀면 도가, 하나 정도 풀면 유가(儒家)인 셈이다. 행진곡과 건전가요가 법가라면 록 음악과 재즈는 도가이며, 이른바 세미클래식과 팝페라는 유가인 셈이다. 요컨대 유가는 자연과 인위의 중용을 취하려 한다.
이는 <논어>(論語) 옹야(雍也)편에서 공자(孔子)가 말한 문질빈빈(文質彬彬)에도 나타나 있다. 공자는 ‘바탕이 꾸밈을 이기면 상스럽고 야해지며, 꾸밈이 바탕을 이기면 실질이 없어지고 겉만 그럴듯해진다. 꾸밈과 바탕이 조화를 이루어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선비들의 봄 소풍은 단순히 경치를 즐기고 음식 먹으며 술에 취하는 ‘관광’(sightseeing), 그러니까 질(質)에 치우친 활동이 아니었다. 자연을 통하여 인간 세상의 도리를 새삼 깨우치기도 하고, 자연의 정경과 그것에서 느낀 점을 인위의 극치라 할 문장(文章)으로 승화시켜 노래하는 인문 활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문 활동으로서의 봄 소풍의 원형을 <논어> 선진(先進)편에서 볼 수 있다. 공자가 자로(子路), 증석(曾晳), 염유(?有), 공서화(公西華) 등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물었다. “어떤 사람이 너희들의 학식과 덕을 알아보고 등용한다면 어찌 하겠느냐?” 이에 대해 자로와 염유와 공서화는 각자의 정치적 포부를 밝혔지만 증석은 달랐다.
“늦은 봄, 봄옷을 갖추고 대여섯 명 어른과 예닐곱 명 아이들과 함께 기수(沂水)에 나가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올라가 바람 쐬며 시나 읊다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나의 생각도 점(點 : 증석)과 같다’고 말한 뒤, 세 사람이 자리에서 떠나고 혼자 남은 증석에게 자로, 염유, 공서화 등의 대답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말해주었다. 공자는 역사와 노동의 세계, 즉 인위의 범주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만을 중시한 사람이 아니다. 공자는 자연 세계에서 은일(隱逸)하여 노니는 소요(逍遙)의 삶에 대한 희구를 외면하지 않았다.
선비들의 봄 여행에는 술이 빠지지 않았고 때로는 대취하여 인사불성에 이를 때마저 없지 않았다. 권문해(權文海 1534∼1591)의 <초간일기>(草澗日記)에는 그가 1581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여 지역을 여행한 기록이 나와 있다. 그는 도착한 날 밤과 그 다음 날 밤에 술을 마셨는데 함께 간 친구 홍적이 크게 취하여 길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일행은 자온대, 고란사, 조룡대, 낙화암, 이은암, 소정방비(蘇定方碑) 등을 둘러보며 부여 일대의 자연을 감상하고 역사를 회고했다.
5월 20일의 경우 권문해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아침 식사 후에도 조룡대에 올라 수령들과 술잔을 돌렸다. 정오 즈음 낙화암 아래로 자리를 옮겨 배를 묶어두고 이은암에 올라 홍적과 절구를 주고받았다. 절구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옛 땅 천년 역사를 간직한 곳에 / 시인이 작은 배 타고 찾아왔네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듯 / 물고기와 새는 걱정을 모르네
오래된 낙화암 꽃은 다 떨어지고 / 용은 사라졌는데 물은 그대로 흐르네
고란(高蘭)의 터는 여전히 남아 / 후인에게 부끄러웠던 역사를 말해주네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으니 역사적 의미가 심장한데다가 백마강을 중심으로 경치가 빼어난 경승지들이 많다. 빼어난 정경과 심장한 역사성, 즉 자연과 인위가 권문해의 절구를 통해 인문(人文)이 되고 있다. 봄은 자연이다. 소풍은 인위다. 조선 선비들의 봄 소풍은 자연과 인위가 만나고 역사성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인문을 꽃피우는 활동,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 인문학이자 인문적 생활 그 자체였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화두라고 한다. 생활과 인문학이 융합되었던 선인(先人)들의 구체적인 인문활동문화에서부터 진흥의 단서를 찾아봄직 하지 않은가.
스토리테마파크 참고스토리
작가소개
- 표정훈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특임교수)

-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번역과 저술, 평론활동을 해왔다.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등에서 강의했다.
저서 <탐서주의자의 책>, <철학을 켜다>, 번역서 <중국의 자유전통>, <고대문명의 환경사> 등 10여 권의 책을 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번역과 저술, 평론활동을 해왔다.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등에서 강의했다.
피리 불고, 비파 타며 호화여행(?)을 하는 양반
혼자 떠나는 여행길이 영 신이 나지 않고, 초라하게 느껴진 양경우는 어린 노비 둘을 불러 한 동자에게는 피리를 불게 하고, 한 동자에게는 비파를… (더 보기)
강물 위에 흩날리는 꽃잎에 병을 잊은 선비
강은 맑고 날은 따뜻하여 수풀의 잎들은 푸르고 무성하였다. 철쭉은 곳곳마다 언덕을 뒤덮었고 그 빛이 물 밑까지 환하게.… (더 보기)
양반의 유람 뒷바라지에 고단한 승려
가마를 멘 늙은 승려들은 험한 산을 오르려니 금새 지쳐 ‘헥헥’ 거리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더 보기)
조선시대 양반들의 뱃놀이문화
선유(船遊), 주유(舟遊)라고 일컫는 뱃놀이는 강에 배를 띄우고, 시(詩)와 술이 어우러져… (더 보기)
유람중인 양반을 위해 재롱부리다 벌에 쏘인 승려
그런데 갑자기 연못 위로 큰 벌이 날아들어 한 승려의 이마를 쏘니, 승려가 땅에 넘어져… (더 보기)
| 시기 |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 장소 | 출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