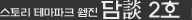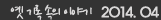이달의 일기(4月) _ 봄, 소풍
피리 불고, 비파 타며 호화여행(?)을 하는 양반
1618년 장성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양경우는 봄을 맞아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 달 간의 긴 여행을 떠난다. 전남 장성을 시작으로 나주를 지나 여행 사흘째 영암에 도착하였다. 4월 19일 양경우는 영암 수령과 월출산 도갑사에 가기 위해 말에 안장을 올리고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영암 관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수령이 갈 수 없게 되어 결국 홀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혼자 떠나는 여행길이 영 신이 나지 않고, 초라하게 느껴진 양경우는 어린 노비 둘을 불러 한 동자에게는 피리를 불게 하고, 한 동자에게는 비파를 타게 하였다. 그가 남긴 유람기<연해군현잉입두류?상쌍계신흥기행록(歷盡沿海郡縣仍入頭流賞雙溪神興紀行錄)>을 보면, “그들을 대동하여 나의 구경을 더 호화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바람처럼 악기의 연주와 노랫가락에 양경우의 유람이 화려해졌다. 어느덧 월출산 골짜기 입구에 도달하니 맑은 시내와 초록빛의 산새가 어우러져 봄의 화사함으로 가득하였다. 양경우는 곧바로 월출산 풍경에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 연주하게하고, 호화롭게 유람을 즐겼다.
그 후, 양경우는 진도, 강진, 장흥, 보성, 고흥, 낙안, 순천, 광양, 악양, 화개를 거쳐 지리산 쌍계사, 불일암, 신흥사에 이르는 긴 여정을 이어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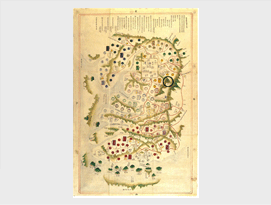
1872년도 영암군 지방지도에서 보이는 영암관아와 월출산
강물 위에 흩날리는 꽃잎에 병을 잊은 선비
1618년 경상북도 예안군 오천에 봄이 찾아왔다. 선비들은 하나 둘 강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 즐기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령은 병에 걸려 거동조차 어려웠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강물은 더 깊이 넘실거리고 봄꽃의 싱그러움은 더하였고, 김령의 안타까운 마음 또한 커졌다. 1618년 3월 26일 하늘이 유난히 맑고 청명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 김령의 아들 이실(而實)이 강에 배를 띄우고 아버지 김령에게 뱃놀이를 권하였다. 김령은 병든 몸이지만 이 봄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아들을 따라나섰다.
배에 오른 김령의 눈에 비친 풍광은 병을 잊게 할 만큼 황홀하였는데, 김령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강은 맑고 날은 따뜻하여 수풀의 잎들은 푸르고 무성하였다. 철쭉은 곳곳마다 언덕을 뒤덮었고 그 빛이 물 밑까지 환하게 비추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절벽 아래에 배를 멈추었는데, 겹겹이 포개지며 위태롭게 치솟은 돌과 바위의 형상이 기이한 경치를 그려내고 있었다. 여종의 노래에 흥을 돋우고, 술잔을 든 이실이 스스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바위 아래 물굽이로 배를 옮기니 풍경은 더욱 아름다웠고, 철쭉이 비단처럼 만개하였다. 꽃을 꺾어 뱃머리에 꽂아두고 남은 꽃들은 강물 위에 흩뿌렸다.”
그러면서 “천만가지로 다른 사람의 삶. 몸과 마음이 서로 들어맞아 한가롭고 고요한 가운데 마음껏 노닐며 만년을 마친다면 더한 즐거움이 있겠는가.”하고 말했다.
-

선상관매도船上觀梅圖
-

도선도渡船圖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

선유도船遊圖 (평양조선미술관 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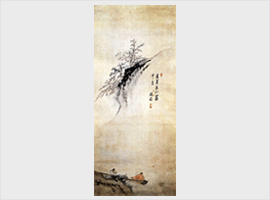
주상관매도舟上觀梅圖 (개인소장)
-

낙동강 상류 절벽 위에 위치한 정자
양반의 유람 뒷바라지에 고단한 승려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승려들의 삶은 어땠을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불교를 탄압하는데 성공을 거두자,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는 무속집단과 같은 천인으로 격하되었고, 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들은 기복(祈福), 기원(祈願), 치병(治病) 등의 방식으로 유가(儒家)를 보조하는 주변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이 수행해 오던 종교적 역할의 많은 부분이 무속과 습합하여 민간 신앙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강력한 선비집단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불교는 가히 굴욕의 시대나 다름없었다. 승려들은 천민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사찰은 선비들의 유람 숙소로 제공됐다. 즉 오늘날 산장 역할을 하며 유생들의 꽃놀이나 등산을 위한 베이스캠프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승려들은 가마꾼을 자청하며, 관리나 선비들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지리산 쌍계사의 승려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1618년 5월 11일에는 장성현감 양경우가 쌍계사의 늙은 승려 8~9명과 지리산에 올랐다. 양경우는 등산에 자신감을 보이며 가마를 치우라 하였지만 몇 리를 가지 못하고 힘이 들자 가마에 올라탔다. 가마를 멘 늙은 승려들은 험한 산을 오르려니 금새 지쳐 ‘헥헥’ 거리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앞길이 멀지 않았다.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전년에 하동군수가 산처럼 뚱뚱했어도 너희들이 능히 감당하였는데 이번 행차에 어찌 수고스럽다고 하느냐?”고 승려들을 채근 하였다.
조선시대 승려들은 부처의 가르침과 뜻에 살아가는 승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노승이 되어서도 무거운 가마를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는 고단한 삶을 살아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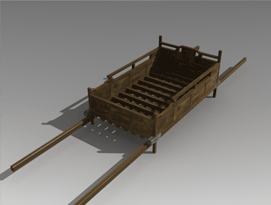
견여
원형스토리 조선시대 승려들의 양반 시중 조선시대 여행수단
조선시대 양반들의 뱃놀이 문화
조선 시대의 뱃놀이는 주로 양반들의 놀이였다. 선유(船遊), 주유(舟遊)라고 일컫는 뱃놀이는 강에 배를 띄우고, 시(詩)와 술이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리는 놀이였다. 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대부에게 뱃놀이는 시원한 물놀이의 하나이자, 자연을 감상하는 유람이었다. 봄이 되면 양반들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을 비롯하여 조선의 강줄기에 배를 띄우고 지인들을 모아 유람을 즐겼다.
1581년 5월 17일 충남 공주 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권문해도 봄을 맞아 금강에 배를 띄우고 지인을 모아 뱃놀이를 즐겼다. 권문해는 가장 먼저 임천군에 사는 그의 벗 흥적(洪迪)을 배에 태우고 정오쯤 임천 인근에서 사는 황익광(黃益光)을 태우고 백마강을 따라 정산(定山)에 도착했다. 여기서 부여수령과 정산수령을 만나고, 본격적인 금강 유람을 시작했다. 금강의 절경 아래 술과 함께 시와 노랫가락이 퍼졌다. 권문해 일행은 고란사(高蘭寺), 자온대(自溫臺), 조룡대(釣龍臺)를 거쳐 낙화암(落花岩), 이은암(吏隱岩)까지 금강을 따라 유람을 이어갔다.
1706년 4월 5일 경상북도 봉화군 강림대(江臨臺) 인근의 낙동강에서는 권성구와 지인 10여명이 뱃놀이를 즐겼다. 물결에 따라 출렁이는 배위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지어 서로 화답해 부르며 밤늦도록 뱃놀이를 즐겼다.
1846년 3월 5일에는 서찬규가 한강에 배 띄우고 창부가 부는 쌍피리를 들으며 봄날의 풍취에 취하기도 했다.
신윤복의 <주유청강(舟遊淸江)>이나 김석신의 <가고중류도(?鼓中流圖))> 에 조선시대 선비들의 뱃놀이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

신윤복 - 주유청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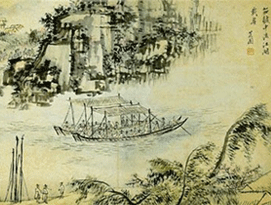
김석신 - 가고중류도(?鼓中流圖)
원형스토리1 원형스토리2 원형스토리3 원형스토리4 조선시대 뱃놀이
유람중인 양반을 위해 재롱부리다 벌에 쏘인 승려
조선시대 사찰은 승려들이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수양하고 기도하는 공간이기 보다는 양반들의 유람 숙소의 공간이었고, 승려들은 양반들이 꽃놀이나 등산을 할 때면 가마를 메고 재롱을 부리며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지리산 사찰의 승려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1618년 (윤) 4월 20일 쌍계사를 찾은 장성현감 양경우는 다리에 종기가 생겨 산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다. 이에 쌍계사의 늙은 승려 하나가 북쪽에 폭포연(瀑布淵)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려들이 발가벗고 노는 모습이 볼 만 하다고 추천하였다. 이에 양경우는 폭포연으로 향하는데, 양경우가 폭포연에 도착하자 젊은 승려 7~8명이 연못 위 바위에 올라서서 두 손으로 음낭을 가리고 다리를 모아 우뚝 섰다가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한 참을 물속에 잠수하였다가 물 밖으로 솟구쳐 나왔다. 젊은 승려들이 하나 둘 순서에 따라 물속에 뛰어내렸다. ‘수준급의 재롱’에 양경우도 감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연못 위로 큰 벌이 날아들어 한 승려의 이마를 쏘니, 승려가 땅에 넘어져 서럽게 울부짖었다. 이에 구경하던 양경우의 마음도 씁쓸해졌다.
-

쌍계사 입구
-

쌍계사 무명폭포
피리 불고, 비파 타며 호화여행(?)을 하는 양반
혼자 떠나는 여행길이 영 신이 나지 않고, 초라하게 느껴진 양경우는 어린 노비 둘을 불러 한 동자에게는 피리를 불게 하고, 한 동자에게는 비파를… (더 보기)
강물 위에 흩날리는 꽃잎에 병을 잊은 선비
강은 맑고 날은 따뜻하여 수풀의 잎들은 푸르고 무성하였다. 철쭉은 곳곳마다 언덕을 뒤덮었고 그 빛이 물 밑까지 환하게.… (더 보기)
양반의 유람 뒷바라지에 고단한 승려
가마를 멘 늙은 승려들은 험한 산을 오르려니 금새 지쳐 ‘헥헥’ 거리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더 보기)
조선시대 양반들의 뱃놀이문화
선유(船遊), 주유(舟遊)라고 일컫는 뱃놀이는 강에 배를 띄우고, 시(詩)와 술이 어우러져… (더 보기)
유람중인 양반을 위해 재롱부리다 벌에 쏘인 승려
그런데 갑자기 연못 위로 큰 벌이 날아들어 한 승려의 이마를 쏘니, 승려가 땅에 넘어져… (더 보기)
| 시기 |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 장소 | 출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