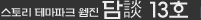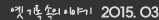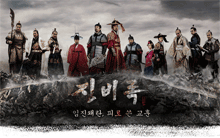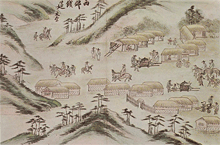영상기록으로 만나는 옛길, 使行路程(1) 출발! 타국을 걷는 길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제작현장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모르는 거야 다반사지만, 벌써 3월이라니! 가는 세월이 아쉽긴 해도, 봄볕 따뜻해지는 날이 어서 오면 좋겠습니다. 상춘(賞春)객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 나들이 계획이라도 세워보게요. 그렇잖아도 독자 여러분께 3월부터 웹진을 통해 옛사람들의 ‘해외여행’, ‘관광’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게 되다 보니 여행 이야기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힐 기회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관광, 유학, 주재원, 그 가족 등 종류와 방식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시대의 해외여행은 어떠했을까요?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특별한 기회, 특정한 계층의 신분이 아니고서는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 인적교류나 해외 견문의 기회가 없었던 이유는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을 외국으로부터 봉쇄한 쇄국, 해금의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시대 국제관계는 사행(使行)이 중심이었고, 조선 시대의 대외정책도 중국과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고 사행무역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른바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정신을 외교관계의 기조로 삼았던 것입니다. 조선의 지식인들 역시 사행단에 합류하여 외국의 문화를 접하고 서구세계와 조우했습니다. 이들이 여행의 견문과 소회를 담담하게 일기체로 남긴 기록이 ‘연행록’, ‘연행일기’와 같은 사행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대표적인 연행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테마파크의 ‘테마스토리’에 <사행, 타국을 걷는 길>이라는 사행 테마가 있고, <감상과 향수>, <만남과 대화>, <문물의 견학>, <사건과 사고>, <사행의 여정>, <사행의 의무>를 주제로 하는 약224건의 사행스토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건은 1911년 안동사람 김대락의 중국 망명생활 스토리이므로 이를 빼더라도 약213여건이 됩니다. 스토리로 개발된 내용이 하나같이 흥미롭습니다. 많은 콘텐츠 창작·제작자들에게 유용한 스토리 창작소재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선 사신들이 중국 북경(또는 열하로)으로 떠났던 사행노정을 영상(기록사진)과 지도를 적극 활용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시하는 현장 기록사진과 지도를 통해 상상으로 머물러 있던 사행공간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행노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행제도와 사행의 목적, 구성, 절차,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연재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행노정의 삼절(三節)
앞으로 사행 노정의 현장을 크게 국내 지역과 중국 지역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내 지역 사행 노정은 조선 제1대로인 의주대로를 기준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신이 중국으로 출발하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복명했던 한양(서울)지역에서의 사행출발 광경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주대로(신춘호.2015)
의주대로(신춘호.2015)
연행의 시작과 끝은 한양(漢陽)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한 사신은 조선 제1대로인 의주대로(義州大路)를 기본 노선으로 삼아 이동하였습니다.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따르면 당시 한양에서 의주까지 약 41개의 역참이 운영되었으며, 양국 사신들을 위한 휴식처와 숙박소로서 모두 25개의 관(館)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지역 의주대로]
한양-돈의문(敦義門)-병전거리(餠廛巨理)-녹번현(녹번峴)-양철평(梁鐵平)-관기(館基)-박석현(薄石峴)-검암참(黔巖站.구파발)-덕수천(德水川)-여현(礪峴)-신원(新院)-(신원천,덕명천)-고양(高陽)-벽제역(碧蹄驛)-혜음령(惠陰嶺)-세류점(細柳店)-쌍불현(雙佛峴)-(쌍미륵)-분수원(焚修院)-신점(新店)-광탄천(廣灘川)-파주(坡州)-이천(梨川)-(화석정)-(이후민간인통제구역)-임진도(臨津渡)-동파역(東坡驛)-유현(柳峴)-장단(長湍)-오목리(吾木里)-견양암(見樣巖)-조현발소(調絃撥所)-판적천교(板積川橋)
사행의 목적이나 사행 참여자의 관심사에 따라 해외에서 견문하는 내용과 활동영역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행 노정이라는 공간(길)은 중국에서 정해준 제도에 따라 운용되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나 사신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서면 북경까지 정해진 노선을 걸어야만했습니다.
옛사람들이 사행 노정을 구분하는 방식은 연행의 삼절(三節), 육처(六處)라 해서 지리공간과 주요 경유 도시를 기준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삼절은 初節(압록강-심양), 中節(심양-산해관), 終節(산해관-북경)을 말합니다. 압록강에서 북경까지는 약 2,050리가 되는데, 십삼산(十三山)이 딱 중간에 위치하여 연행단의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육처는 삼절 구간의 큰 역참이 있었던 도시인 책문·봉황성·요동·심양·광녕·금주를 말합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육처의 지방관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특히 육처의 지방관아에서는 조선 사신들의 중국지역 사행 노정을 관리하고 이동기간에 먹을 양식과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하정(下程)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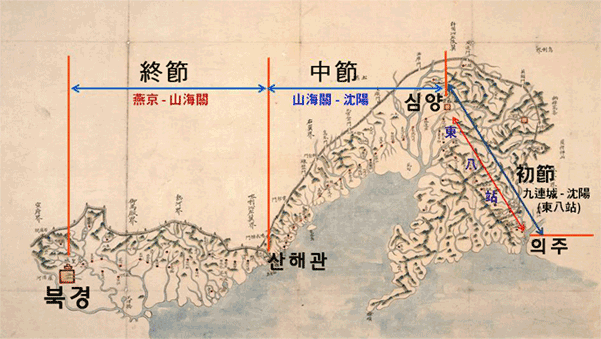 사행노정의 삼절(三節)
사행노정의 삼절(三節)
이 밖에도 사신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리개념을 인식하였는데,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전체 노정을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도강록>, <성경잡지>, <일신수필>, <관내정사>, <막북행정록>, <환연도중록> 등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올해가 마침 연암 박지원과 초정 박제가 선생의 서세(逝世) 2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연재의 범위도 북경까지의 일반적인 사행 경로 뿐 만 아니라 열하까지의 사행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므로『열하일기』의 이동경로를 기본으로 삼아 연재하도록 할 것입니다. 1780년의 박지원과 1790년의 박제가가 다녀온 열하노정은 사행역사에서 단 2회만 있었던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자 그럼 앞서 언급한대로 한양에서 사행이 출발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하고 동료들로부터 전별연을 받고 사행노정에 오르는 장면들의 일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목정사(都目政事)에서 사신으로 선발되다.
사행(使行)은 정사(正使),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을 삼사(三使)로 삼아 사행 임무를 책임지게 하였고, 통역관, 압물관, 화원, 의원 등 약35~40여 명의 수행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을 정관(正官)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말몰이꾼, 상인 등 약200~500여명이 사행에 참여하였습니다. 사행단 구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자제군관(子弟軍官)입니다. 이들은 삼사의 자제나 지인들로 정관이 아니었기에 비교적 사행단의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유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창업(金昌業), 홍대용(洪大容), 박지원(朴趾源), 박제가(朴齊家),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김정희(金正喜) 등 많은 학자들이 자제군관이었습니다.
사신의 선발은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통해 선발합니다. 1777년 사은진주겸동지사의 부사로 참여한 이압의 『연행록(燕行錄)』에 그 과정이 보입니다.
1777년(정조 1) 7월 11일 벼슬아치들의 성적을 평가하여 승진시키거나 면직을 결정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가 열리고 이날 겨울에 출발하는 동지 겸 사은사의 삼사를 결정하였는데, 부사에 1순위로 올라 낙점을 받았다. 정사로 뽑힌 하은군 광(垙)과 서장관에 뽑힌 이재학(李在學)과 함께 혜민서(惠民署)에서 회동좌를 열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10월에는 호조(戶曹)에 나아가 방물(세폐)을 포장하고, 외교문서인 국서를 점검하는 사대(査對)에 참여하였다. 이날 사대에는 의정부의 삼정승과 육조의 판서, 애초에 문서를 만들었던 승문원(承文院)의 제조가 참여하여 꼼꼼하게 살폈다. (이압,『연행록(燕行錄)』, 17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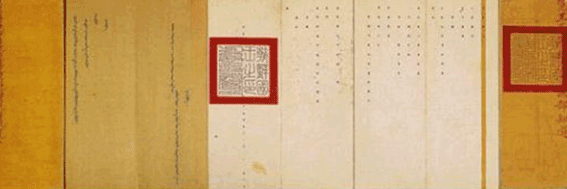 조선에서 중국에 보낸 외교문서 표문(表文)(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에서 중국에 보낸 외교문서 표문(表文)(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대(査對)란 황제에게 바치는 표문(表文)과 6부에 바치는 자문(咨文)을 살펴 틀린 글자가 있는지 나중에 외교적인 문제가 될 표현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로, 서울에서 떠나기 전에 3번, 도중에 3번 이상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행의 삼사(정사‧부사‧서장관)가 창덕궁에서 임금께 하직을 고하면 곧장 종로통을 거쳐 숭례문이나 돈의문으로 나가 의주대로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신은 서대문 밖 경기감영이나 모화관(慕華館)에서 다시 한 번 사대(査對)를 행합니다. 그만큼 외교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에게 하직하고 친지들의 전별을 받다.
사신이 한양에서 출발하는 과정은 1662년 진하겸진주사 정태화(鄭太和)의 『임인음빙록』과 1777년 사은진주겸동지사의 부사로 참여한 이압의 『연행록(燕行錄)』을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62년 7월 26일, 진하겸진주사로 선정되어 청나라에 가게 되었다. 오늘은 대궐에 들어가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갔다. 부사인 허적과 함께 대궐에 들어갔는데, 서장관은 함께 갈 수 없었다. 임금은 초피(豹皮)․단목(丹木)․납약(臘藥)․선자(扇子) 등의 물건을 하사하시면서 이번 사행의 임무를 잘 수행해 달라 당부하였다. 정태화와 허적은 임금 앞에서 사례하며 절을 올리니, 임금이 먼 길의 고생을 미리 위로하고 전송하였다. (정태화,『임인음빙록』, 1662년)
서울은 사신들이 출발에 앞서 임금께 하직하고, 사행에서 돌아와 복명했던 궁궐이 있는 곳입니다. 사행노정에 오르는 사신은 출발일 아침에 궁궐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직하는 숙배(肅拜)를 행했습니다.
-
창덕궁 인정전과 희정당(우측)
-
경복궁 근정전
임금이 사신의 접견을 받은 곳은 경복궁 소실 이후엔 창덕궁 인정전(仁政殿)이나 희정당(熙政堂)등이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이압은 정조에게 희정당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정조는 무사히 다녀오라는 격려와 함께 담비 가죽으로 된 귀싸개(耳掩) 2개와 쥐 가죽으로 만든 귀싸개 1개를 가져오게 하여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겨울철 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방한 도구였습니다.
청나라에 보낼 문서를 받아 확인을 마친 후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 임금이 친히 내린 술을 받아 마신 이후 길을 떠나는데, 동생인 호조판서와 경기감사가 친히 나왔고, 부사의 아우인 허질 역시 전송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사현 고갯길을 넘으니 시장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옆에 모여서 절하고 서로 이별하였는데, 이런 광경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정태화,『임인음빙록』, 1662년)
-
모화관 터(우리은행 독립문지점)
-
모화관의 건축양식을 옮긴 독립관
사대를 마치면 모화관과 홍제원에서는 사신을 전송하는 전별연이 열렸습니다. 모화관에서는 삼사신과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홍제원에서는 해당 관아의 관리들이나 가족, 친지들의 전송이 이어졌습니다. 모화관 옛 터는 현재 우리은행 독립문지점이며, 인근 서대문 독립공원에 독립관과 영은문 주초석이 남아 있어 사신왕래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서교전의도(국립중앙박물관)
-
서교전별도(이혜옥 소장)
<서교전의도(西郊餞儀圖)>는 1731년, 겸재 정선(1676-1759)이 중국 사행 떠나는 친구 이춘제(사행의 副使)를 송별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하단에 모화관과 영은문이 보이며, 말을 탄 이들이 영은문을 지나는 장면입니다. <서교전별도(西郊餞別圖)>는 사행단이 서교에 전송 나온 이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는 두 사람이 메는 가마(轎)가 보이고, 오른쪽 하단에는 초헌(바퀴가 하나인 수레)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행은 모화관과 홍제원에서 전별연을 마친 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해가 뉘엿거릴 때쯤 고양 땅으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두운 녘에 고양 관아의 별관인 벽제관(碧蹄館)에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연행록은 “이날 30리를 가서 벽제관에 들었다.”라고 소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은 중국의 칙사가 오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화관까지 나가 자국의 사신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실의 오랜 숙원 과제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처리하고 돌아온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해 직접 모화관에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계변무는 왕실의 법통을 바로잡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십 차례의 사신을 보내 처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외교현안이었습니다. 이를 잘 처리하고 돌아온 사신들에 대해 국왕의 기쁨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1584년 9월 12일, 우리(배삼익과 원사안)는 영서역(迎曙驛)에서 유숙하였다. 주상(선조)께서 직접 내려준 서찰을 받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신 길에 하인들 중에 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만 리 밖 먼 곳을 무사하게 갔다가 돌아와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왔고 또 『회전(會典)』을 베껴 와서 나에게 그 내용을 알게 해 주었다. 이것은 모두 충심으로 일을 처리하고 외교업무를 수행한 결과이니 진실로 기쁘기 한량없다. 그대에게는 내구마(內廐馬) 1필을 내리고, 서장관 원사안(元士安)에게는 망아지 1필을 내리노니 사양하지 말라." 다음날 삼가 주상께서 직접 모화관(慕華館)으로 마중을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황공하고 두려워 몸 둘 곳을 몰랐다. 한밤에 모화관으로 말을 달려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주상께 아뢰고 하사 받은 물건인 망룡금(蟒龍錦)으로 만든 옷감과 여러 색단(色段) 등의 물건을 바쳤다. ( 배삼익,『朝天錄』, 1584년)
사행임무를 마친 사신들의 귀국 경로 역시 의주대로를 이용하였으며, 사신들은 한양으로 돌아와 임금께 복명(復命)함으로써 사행의 임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행의 출발이 시작되는 궁궐에서부터 전별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행의 출발과 복명의 한 일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면 관계상 소소한 사행 에피소드를 공유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본격적인 사행 노정의 현장을 소개하는 다음 여정에 궁금증을 키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고양-파주-임진나루를 건너 북한지역 의주대로에서 사신들의 행적을 찾아보겠습니다.
 독립문공원의 영은문 주초석과 의주대로 무악재
독립문공원의 영은문 주초석과 의주대로 무악재
스토리테마파크 참고스토리
작가소개
- 신춘호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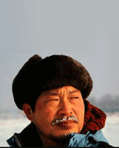
- 한중연행노정답사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역사공간에 대한 영상기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연행노정 기록사진전’을 진행하였고, TV다큐멘터리 ‘열하일기, 길 위의 향연’(4편)을 제작(촬영·공동연출)하였다. 저서는 <오래된 기억의 옛길, 연행노정> 등이 있다.
“옥연정사 가는 길”
“헤드쿼터에서 본 임진왜란,
<징비록>”
“출발! 타국을 걷는 길”
| 시기 |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 장소 | 출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