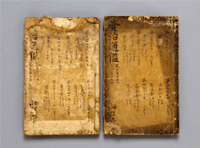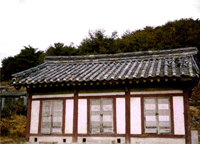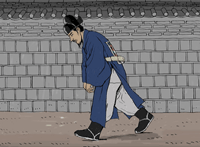민심 - 백성의 마음이 움직이다
제 나라 백성에게 부정당한 조선의 자존심
도성의 궁중에 설치된 관공서에 불이 났다. 임금의 어가가 떠나려 할 즈음 도성 안의 간악한 백성이 먼저 내탕고(內帑庫: 임금의 개인 재산을 보관하는 창고)에 들어가 보물을 다투어 가졌다. 그러다 이윽고 어가가 도성을 떠나자 혼란에 빠진 백성들이 크게 일어나 먼저 장례원(掌隷院)과 형조(刑曹)를 불태웠으니, 이는 두 곳에 공노비와 사노비의 문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궁성의 창고를 크게 노략질하고는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다. 이 때문에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는데, 창경궁은 바로 순회세자(順懷世子: 明宗의 아들)의 빈(嬪) 윤씨(尹氏)의 관을 안치해 둔 곳이기도 했다. 역대로 왕실에 전해지던 보물과 문무루(文武樓: 경복궁 근정전 앞 회랑 동서쪽에 각각 있던 융문루隆文樓와 융무루隆武樓)와 홍문관에 간직해 둔 서적, 춘추관에 보관되어 있던 선대왕들의 실록(實錄)과 다른 창고에 보관된 고려왕조의 사초(史草) 그리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모두 남김없이 타버렸고, 내외의 창고와 각 관서에 보관된 것도 모두 도둑을 맞아 먼저 불탔다. 임해군(臨海君)의 집과 병조판서 홍여순(洪汝諄)의 집 또한 불에 탔는데, 모두 평상시 축재를 많이 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유도대장(留都大將: 임금이 다른 곳으로 거동할 때 도성을 지키는 책무를 맡은 관리)이 몇 사람을 참수하여 군중을 경계시켰으나 혼란에 빠진 백성이 떼로 일어나서 금지할 수가 없었다.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1592) 4월 14일, 28번째 기사
조선이 개국하면서 지어진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누구의 손에 불타 이후 270여 년 동안 말 그대로 ‘황성 옛터’로 쓸쓸히 남겨졌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록이다. 조선의 자존심이었던 경복궁은 왜적이 아니라 그 조선의 백성들 손에 의해 불탔던 것이다. <교수신문>이 지난해 말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인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절로 떠오르는 대목이다.
군주는 배, 백성은 물
‘군주민수’는 “군주는 배[舟]고, 백성은 물[水]”이라는 뜻이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많이 알려진 대로, 이 말의 출전은 동양고전 가운데 하나인 「순자(荀子)」이다. 「순자」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두 번 나온다. 한 곳은 동양의 정치 이상인 왕도정치의 조건을 논한 「왕제(王制)」편이고, 다른 한 곳은 공자와 그의 고국인 노(魯)나라 군주 애공의 문답으로 구성된 「애공(哀公)」편이다. 이 가운데 후자는 순자 본인이 직접 저술한 것이 아니라는 위작 혐의를 종종 받고 있어 이 말의 출전은 일반적으로 「왕제」편으로 통용된다.
두 곳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왕제」편의 해당 구절을 앞뒤 문맥을 살려 옮기면 이렇다.
말이 수레에 놀라면 타고 있는 군자가 수레를 불안해하고, 백성이 정치에 놀라면 다스리는 군자가 그 지위를 불안해한다. 말이 수레에 놀라면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이고, 백성이 정치에 놀라면 선정을 베푸는 것이 제일이다. 어질고 선량한 사람을 등용하고, 뜻이 독실하고 경건한 사람을 천거하며, 효성과 우애가 지극한 사람을 북돋워주고, 고아와 과부처럼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거두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도와준다면, 백성이 정치를 편히 여길 것이다. 백성이 정치를 편히 여긴 뒤라야 통치자는 자리를 편히 여길 수 있다. 전하는 말에 ‘군주는 배고 일반서민은 물이니, 물은 곧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고 했으니, 이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馬駭輿, 則君子不安輿, 庶人駭政, 則君子不安位. 馬駭輿, 則莫若靜之, 庶人駭政, 則莫若惠之. 選賢良, 擧篤敬, 興孝弟, 收孤寡, 補貧窮, 如是則庶人安政矣. 庶人安政, 然後君子安位. 傳曰: ‘君者, 舟也; 庶人者, 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此之謂也.
 군주는 배고 일반서민은 물이니, 물은 곧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군주는 배고 일반서민은 물이니, 물은 곧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통치자의 지위와 권위는 전적으로 백성들이 그가 행하는 정치를 편히 여기느냐의 여부에 그 존망이 달려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교수신문]이 이것을 바탕으로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군주민수’를 만들어낸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해 10월부터 말 그대로 ‘경향(京鄕)’ 각지를 달구고 있는 촛불집회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교수신문>의 ‘올해의 사자성어’ 시리즈와 현 정부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듯하다. 박근혜정부가 등장한 이후 지난해까지 선정된 4번의 사자성어는 모두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다. 첫해인 2013년에는 상식과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만 일삼는다는 뜻의 ‘도행역시(倒行逆施)’였고, 둘째 해인 2014년은 마치 사슴을 말이라고 속이듯 권력 측근들이 윗사람을 속이며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른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였으며, 셋째 해인 2015년은 어리석은 군주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는‘혼용무도(昏庸無道)’였다. 그 결과, [교수신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지난해의 ‘군주민수’를 포함하여 4번의 사자성어는 공교롭게도 하나의 의미연관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첫해부터 국민의 바람이나 뜻과는 어긋나는 정치를 행하더니 호가호위하는 측근들에 의해 권위와 권력을 농락당해 결국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마침내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퇴진 압박을 받는 형편에 직면했다는 이야기이다.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관계없이 현 정부는 이미 자신을 띄워주던 바로 그 ‘백성’들에 의해 전복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내용을 지금처럼 실감하는 때도 그리 흔치 않을 성싶다.
‘민본(民本)’, 그 오래된 미래의 기원
그런데 ‘군주민수’의 출전인 「순자」의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군주는 배고 일반서민은 물이니, 물은 곧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는 경구가 순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이 구절이 ‘전하는 말에[傳曰]’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또 한 군데 출전인 「애공」편에서도 이것은 공자가 자신이 전해들은 것을 애공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통치권의 존재 기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곧 ‘백성’이라는 인식은 동양에선 훨씬 오래전부터 숙성되어 온 생각이다. 그 기원은 기원전 11세기에 건국된 중국의 주(周)나라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주나라는 앞선 왕조인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워진 왕조이다. ‘하걸은주(夏桀殷紂)’라는 말도 있듯이,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紂)는 하나라 마지막 왕인 걸(桀)과 함께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폭군으로 꼽힌다. 주나라의 건국세력은 이런 은나라의 폭정을 물리치고 기원전 11세기 새롭게 천하의 패권을 잡았다. 예나지금이나 권력을 잡은 세력의 첫 번째 고민은 동일하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가 특히 더 그러한데, 그것은 자신들의 통치권 획득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나라 건국세력은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자 곧바로 자신들의 이른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주나라의 건국세력이 착수한 작업은 기존의 ‘천명론(天命論)’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었다. 서양 고중세의 왕권신수설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로 올라갈수록 통치권의 정당성은 ‘신(神)’이나 ‘하늘[天]’과 같은 절대자와 연결시키는 것이 통례이다. 이점은 중국 고대에도 마찬가지여서, 은나라 통치세력은 자신들의 통치권의 정당성을 하늘과 연결시켰다.
 ‘하늘 뜻’인 ‘천심(天心)’은 곧 ‘백성 뜻’인 ‘민심(民心)’을 통해 표출
‘하늘 뜻’인 ‘천심(天心)’은 곧 ‘백성 뜻’인 ‘민심(民心)’을 통해 표출
은나라는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시대였다. 특히 조상신 관념이 팽배하여 모든 부족의 조상은 죽은 후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어 지상의 후손들과 수시로 교통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은나라 통치세력은 이러한 조상신 관념을 자신들의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렇게 각색하였다. 모든 부족의 조상은 죽은 후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된다. 그런데 그 하늘의 신들 사이에는 서열이 있다. 그 결과 다른 조상신을 압도하는 권위를 지닌 최고의 조상신, 즉 ‘지고신(至高神)’이 존재한다. 하늘에 있는 조상신들의 세계는 이 지고신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가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다. 그런데 은나라 통치세력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지고신이 바로 자신들 부족의 조상신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삼단논리가 성립한다. a) 지상의 통치권은 ‘천명’의 형식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b) 하늘의 최고신인 지고신은 은족의 조상신이다. c) 그러므로 은족의 통치권에 부여된 ‘천명’은 영원하다.
주나라 건국세력이 천하를 얻은 후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러한 은족의 천명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만약 은족의 천명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은 하늘의 뜻을 거스른 부족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나라 건국세력은 기존의 천명론을 새롭게 수정하였다. 내용인 즉, 하늘의 명인 천명은 어느 부족에 주어졌다고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쳇말로 ‘사랑’이 그렇듯 ‘천명’도 동사(動詞)라는 주장이다.
하늘은 특정한 부족의 조상신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다. 하늘은 천하 사람들을 고르게 사랑한다. 따라서 지상의 통치권도 어느 한 왕조에게 영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옮겨간다. 옮겨가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상에서 수행되는 정치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이다. 이에 따라 천명을 부여받은 세력이 정치를 잘 해나가면 통치권은 지속되지만, 반대로 정치가 부패하면 천명은 회수되어 다른 부족에게로 넘어간다. 정리하면, 이것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천하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다. 요컨대, 주나라 건국세력인 자신들은 천명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폭정으로 정치를 그르친 은족을 대신하여 천명을 새롭게 부여받았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주나라 건국세력은 자신들의 통치권을 정당화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천명론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양날의 칼이었다. 왜냐하면 천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곧 자신들의 통치권도 영속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과제가 발생한다. 천명이 다른 부족에게로 다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나라 건국세력은 통치그룹에게 정치의 방향을 하늘이 아닌 백성들에게로 돌릴 것을 주문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각색한 천명론에 따르면, 하늘이 정치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근거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즉 ‘하늘 뜻’인 ‘천심(天心)’은 곧 ‘백성 뜻’인 ‘민심(民心)’을 통해 표출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다시 도출된다. 통치권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가? 그러면 백성들의 신임과 지지를 얻어라! ‘민본(民本)’ 즉 ‘백성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동양정치사상의 가장 오래된 강령이 탄생하는 대목이다.
‘민본’과 ‘민주’ 그리고 ‘민심’
물론 ‘민본’과 우리시대의 화두인 ‘민주’는 결이 다르다. 민본정치는 군주정이나 귀족정과 양립할 수 있지만, 민주정치는 이것들과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 둘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교집합 또한 존재한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간에 정치의 성패는 결국 ‘민심’이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민심을 얻으면 정치권력은 비상할 수 있지만 민심이 등을 돌리면 날개도 없이 추락한다. 따라서 민심의 동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감지했더라도 무시 또는 그와 대적하는 결기만 내세우는 정권은 비록 연명된다 하더라도 이는 뇌사상태에 이른 식물정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420여 년 전 제 백성들에 의해 부정당한 통치자의 모습이 보여주는 대로이다.
임진왜란 발생 초기 좌찬성으로 있으면서 선조를 의주까지 호위했던 정탁(鄭琢: 1526∼1605)은 당시를 기록한 자신의 일기에서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권력이 겪어야만 했던 계속되는 피난길 치욕을 이렇게 전한다.
임금의 어가가 영변부(寧邊府)로 출발하려 하자, 본부(本府: 평양부)의 군민(軍民)들이 무리를 이루어 길을 막고서는 떠나지 마시라고 극력 주청을 올려 결국에는 어가가 떠나지 못했다. ― 「피난행록(避難行錄)」 6월 9일자
정탁, 피난행록, 1592-05-07 ~ 1592-06-09
이 어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을 조선왕조실록 또한 다음과 같이 가감 없이 기록하여 자신들이 띄웠던 배를 뒤엎는 민심의 무서움을 경계시킨다. 이래저래 순자와 함께 유학의 초기 방향설정에 초석을 놓았던 맹자(孟子)의 유명한 말,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가 제일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통찰이 오버랩되지 않을 수 없는 시국이다.
임금이 평양에 있었다. …… 성안이 흉흉하여 조정 의논이 강계(江界)로 어가를 옮겨 가자고도 하고 혹은 함흥으로 가자고도 하였다. …… 중전(中殿)이 함흥으로 가기 위하여 시중드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자 평양 군민(軍民)들이 난을 일으켜 몽둥이로 궁의 계집종을 쳐 말 아래로 떨어뜨렸으며, 호조판서 홍여순(洪汝淳)은 길에서 성난 병사들을 만나 맞아서 등을 다쳐 부축을 받고 돌아왔다. 거리마다 칼과 창이 삼엄하게 벌여 있고 고함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는데 모두들 임금의 어가가 성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 하였다. …… 이날 성안의 성난 병사들이 소란을 그치지 않으므로 중전이 끝내 길을 떠나지 못하였다. 관찰사 송언신(宋言愼)이 아랫사람을 시켜 난을 주동한 사람 두어 명을 참수해서 효시하여 군중을 경계하니 군중들이 마침내 진정되었다. ―《선조실록》27권, 선조 25년(1592) 6월 10일, 1번째 기사
정탁, 피난행록, 1592-05-07 ~ 1592-06-10
작가소개
- 박원재 박사

- 자유 집필가. 전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고려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유학은 어떻게 현실과 만났는가], [군자의 나라](공저), [철학, 죽음을 말하다](공저), [500년 공동체를 움직인 유교의 힘]등이 있다.
“뒷배 믿고 기고만장한 관노, 말에서 내릴 줄을 모르다”
“ 서책을 찍을 종이를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이다 ”
“ 7년 간 휘두른 영의정의 무소불위 권력, 서서히 막을 내리다 ”
“ 성난 평양 백성들, 목숨 걸고 왕의 피난길을 막아서다 ”
“ 규정을 위반한 좌수, 마을의 논의를 통해 파직되다 ”
| 시기 |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 장소 | 출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