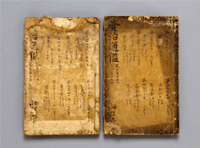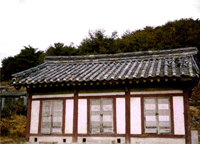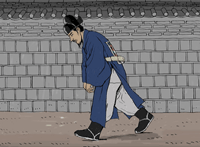새해, 희망을 품고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가르는 기준은 시대마다 달랐고 또한 문화적인 전통에 따라 상이하지만, 적어도 낡고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고 싶은 소망은 모두에게 공통인 듯합니다. 작년 힘든 한해를 보낸 우리 사회는 그 소망이 더욱 절실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사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위기 중의 가장 무겁고 큰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였습니다.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그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위협받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도덕적 이념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자라납니다. 사적인 이해와 사적인 계산을 넘어서 모두를 아우르는 공적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정치지도자나 하나의 정당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설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정치적 가치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계속된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호 웹진 “담담”은 백성과 나라에 대한 이런 고민을 담기로 했습니다. 교수신문이 2016년 한 해를 규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을 정도로, 백성과 나라가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또한 어떻게 상호작용을 이어나가야 하는가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박원재 선생님은 “민심-백성의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군주민수”의 출전인 “순자”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뜻을 밝히고 나아가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는 통찰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정철 선생님은 “민과 권력”이라는 글로 조선의 정치 이념과 현시대의 촛불을 비교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백성과 권력의 관계를 통해 풍요롭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11회째를 맞이하는 장순곤, 이승훈의 “요건 몰랐지?”는 암행어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유쾌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정치를 감시하는 효율적 수단이었던 암행어사 제도가 여러 폐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토록 귀중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임세권 선생님의 4번째 후이저우 이야기는 “후이저우 마을의 랜드마크 패방(牌坊)”입니다. 마을의 대문이기도 하며, 국가나 사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기리기 위한 상징물 패방을 통해 후이저우가 품은 이야기를 멋진 사진과 함께 담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테마파크의 원천 자료인 일기와 그 저자를 소개하는 “선인의 일기”를 전합니다. 그 첫 번째 일기는 김령의 “계암일록”입니다. 김형수 선생님께서 “17세기 한 선비가 글로 그린 삶의 풍경화, 계암일록”이라는 글을 통해 계암일록의 가치와 저자 김령의 다양한 면모를 담아주셨습니다. 한편, 스토리테마파크에는 김령의 계암일록에서 추출한 이야기 소재 676건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1월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가 가득합니다. 새롭게 모두 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희망 또한 가득합니다. 어둠과 그림자는 잠깐 스쳐 가는 이야기일 뿐, 종국에는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일어서고 모두가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담담”을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뒷배 믿고 기고만장한 관노, 말에서 내릴 줄을 모르다 ”
“ 서책을 찍을 종이를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이다 ”
“ 7년 간 휘두른 영의정의 무소불위 권력, 서서히 막을 내리다 ”
“ 성난 평양 백성들, 목숨 걸고 왕의 피난길을 막아서다 ”
“ 규정을 위반한 좌수, 마을의 논의를 통해 파직되다 ”
| 시기 |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 장소 | 출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