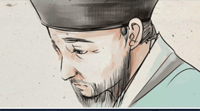부자유서(父子有序) - 할아버지의 슬픔

아버지가 기어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묘소에 다녀와,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앞에 과일과 포를 차렸다. 할아버지가 술잔을 올리고 제문을 읽었다.
정사년 4월 15일, 늙은 아비가 아들 평온의 영전 앞에 섰다. 몸은 이곳 한곡에 남으나, 산양으로 떠나는 네 영혼을 위로하기에 술을 따르고 아뢴다. 너의 맏아들 중소는 네 신주를 받들어 집으로 돌아가고, 둘째 중렴은 여기 남아 네 묘를 보살피며, 글을 배우게 하련다. 이는 평소 네 뜻을 따르려는 것이다.
제문 읽기를 마친 할아버지가 곡을 했다.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슬픔과 아픔이 엉킨 할아버지의 곡소리는, 함께 한 사람들의 가슴을 천근만근의 무게로 누르며 후볐다. 나는 할아버지 곡소리에 맞추듯 ‘아이고, 아이고’, 곡을 했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다.
“이제, 출발 하여라!”
할아버지 목소리는 뭉툭하고 메말랐다. 소리에 색깔이 있다면 먹빛이었으리라. 얼굴은 굳어서 수염 한 가닥 움직이지 않았고, 흔들림 없는 눈길은 영원히 닿지 못할 먼 곳을 향해 있었다.
향정자를 받쳐 들고 나가는 형의 뒤를 숙부와 사촌들, 그리고 하인들이 따라나섰다. 형은 발을 뗀 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대문을 벗어났다. 나는 떠나는 일행을 멍하니 바라볼 따름이었다.
짚단처럼 서 있는 할아버지를 큰아버지가 붙잡고 사랑채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곧게 걸으려는 듯 목과 등을 세웠으나, 걸음걸이는 버석거리고 단조로웠다.
덩그러니 남은 나는 처음 와본 곳을 살피듯, 집안을 둘러보았다.
명절을 쇠거나 집안 행사가 있어 올 때면 항상 즐거웠고, 그래서 더 머물고 싶어 했던 곳이다. 일정이 끝나 산양 집으로 돌아가려면, 나는 투정을 섞어 조르곤 했었다.
“아버지, 왜 큰아버지네만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우리도 여기 함께 살아요, 네?”
아버지가 다정한 웃음을 보내는 사이, 형이 먼저 대답했다.
“큰아버지가 장손이잖아. 다 큰 놈이 그것도 모르냐.”
“치이, 할아버지는 큰아버지랑 아버지를 차별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때서야 내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 중렴이 눈이 덜 뜨였구나. 할아버지께서는 자주 못 보는 나를 더 애틋해 하시는데, 그걸 못 보니 말이다.”
“우리도 함께 살면 좋잖아요.”
나는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는 물론 사당까지 있는 할아버지네 넓은 집이 좋았다. 할아버지는 참봉어르신으로, 나는 참봉 댁 손자로 불리는 것도 듣기 좋았다. 무엇보다 글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사랑대청에 가득 차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 틈에 앉아 할아버지께 배우는 글도 재미있었다.
형은 사촌 중길이와 터울이 덜 진 탓에 티격태격 하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 서두르며, 나 때문에 늦어질까 봐 톡 쏘아댔다.
“여기가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남아.”
형이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닌 나를 바라보았다. 더 있고 싶으면 그리하라는 듯이. 그렇더라도 부모님과 떨어지면서까지 남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했던 탓에, 오늘 형은 집으로 가고 나 혼자 남은 건가?’
아버지 없이 혼자 남으니, 벌을 받은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 댁에서의 생활은 몹시 외로웠다. 나보다 슬픈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를 따라 멀리 떠났는지, 따스한 손길은커녕 뵐 기회조차 없었다. 내가 이 집에 있다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나는 아버지 산소에 들러, 봉분을 덮은 잔디가 뿌리를 잘 내리는지 살펴보았다.

‘흐흐흑….’
하염없이 흐느끼는데,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는 구분되지 않았다. 아버지를 여읜 내가 불쌍해서인지, 세상 떠난 아버지가 가여워 우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소쩍새만 처량하게 우짖으며 슬픔을 보탰다.
묘 앞에 마냥 누워 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가 오셨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른 일어나 앉았다. 청설모 한 마리가 지나갔다.
나는 날마다 아버지 무덤에 가는 것으로 슬픔을 달랬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슬픔은 심심함이나 지루함으로 점점 바뀌어갔다. 그러다보니 내게 관심 없는 큰댁 식구들이 미웠다. 누구보다 할아버지가 미웠다.
‘할아버진,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 아니니까, 덜 사랑하신 거야. 형은 집으로 보내고 나만 여기 남긴 것만 봐도 확실해.’
섭섭한 마음이 들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곳에 가면 아버지가 예전처럼 계실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나만 안고 있는 슬픔이 싫어서, 할아버지 댁을 벗어나고 싶었다.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까 궁리하며 산소에서 내려왔다. 생각이 정리된 건 아니지만 무작정 사랑채로 갔다.
사랑방 앞 댓돌에 막 올라서는데, 근심 가득한 큰아버지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님, 평온이는 그만 찾으세요. 제발, 잊으셔야 해요.”
주눅 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다.
“잊는다고 잊어지겠느냐.”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자식 앞세운 일보다 더 큰 일이 또 있다던.”
할아버지가 밭은기침을 한 후, 물었다.
“니 동생 평온이가 돌잡이 할 때, 뭘 잡았는지 아느냐?”
“글쎄요.”
“천자문과 붓을 집었느니라.”
“그래서 저보다 학문을 더 좋아했군요.”
“그것들을 잡았다고 좋아하다니, 나는 못난 애비다. 애비가 아니라 죄인이다.”
‘우리아버지가 무명실을 잡았더라면, 정말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나는 아버지가 돌잡이였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려했지만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게 어찌 아버님 잘못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니까, 아무 거나 마구잡이로 잡은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게야. 돈, 쌀, 화살, 그딴 것들 다 치우고, 무명실과 국수만 놨어야 했다.”
할아버지의 말은 넋두리가 되어 이어졌다.
“그랬더라면, 내 아들 평온이가 무병장수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되고 후회될 줄이야!”
“돌상 차리는 거야, 정해진 풍습이잖아요. 그러니 제발 마음을 추스르셔요.”
큰아버지의 위로에도 아랑곳 않고 할아버지의 푸념이 이어졌다.
“과거 급제하면 뭐 하고, 가문의 영광은 무슨 소용이더냐. 자식 놈 하나 살리지 못하면 죄인이지.”
“천지사방으로 약 구하러 다니셨잖아요. 듣는 약이 없었는데 어쩌겠어요.”
“자식 앞세운 이 아비는 죄인이다, 누구도 볼 낯이 없어.”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기력을 찾으셔요.”
“죄인이 기력을 찾은들 어디에 쓰겠느냐.”
“유생들이 오래도록 공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야지요.”
“난 가르칠 자격이 없다.”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고서 말했다.
“그만 나가 보거라.”
큰아버지가 방을 나오는 소리에 나는 엉거주춤했다.
나를 본 큰아버지가 가여운 눈빛으로 물었다.
“왜, 와 있니?”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하렴. 많이 아프시다.”
“의원을 부르지 그러셔요?”
큰아버지는 중문간 쪽으로 가며 혼잣말을 하셨다.
“상명지통엔 듣는 약이 없으니 의원이 온들….”
나는 따라가며 물었다.
“어떤 증상인데요?”
“자식 잃은 슬픔에서 오는, 눈이 멀 정도로 큰 통증이란다.”
고개를 갸웃거린 나는 섭섭해 하고 있던 걸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 묘에 가시지 않아요?”
큰아버지는 나를 빤히 바라보셨다. 한참 후에야 축축한 목소리로 물었다.
“중렴아, 네 아버지는 어디에 묻혀 있느냐?”
“산….”
어이없는 물음에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말끝을 흐렸다.
“그래, 우린 모두 네 아버지를 산에 묻었지. 허나, 할아버지는 당신 가슴에 묻었단다.”
“?”
“너는 하루에 몇 번 아버지 묘에 다녀왔느냐?”
“한 번이지요.”
“할아버진 하루 종일, 당신 아들 무덤에서 눈이 멀도록 울고 계신단다.”
큰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와 나는, 너와 중소처럼 친형제지. 친동생이 세상 떴으니, 내가 얼마나 슬프겠니? 하지만 자식을 잃은 할아버지에 비하면 내 슬픔은 보이지도 않는단다.”

내가 말뜻을 알아들은 것으로 보였는지, 큰아버지는 행랑채로 들어서며 말했다.
“할아버지께 들어가 보아라.”
나는 한참을 멍청히 서 있다가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수척해진 할아버지를 뵈니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무슨 할 말이라도….”
말을 잇지 못하는 할아버지 앞에 나는 꿇어앉았다. 내 입에서는 마음먹고 있던 생각 대신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할아버지, 제게 학문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바랐다면서요?”
할아버지가 나를 안으셨다.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안고만 계셨다.
자리에 눕는 할아버지를 거들어 드리고 방을 나오는데 중얼거리셨다.
“미안하구나. 아비를 꼭 닮은 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단다.”
그날 저녁부터, 큰아버지 대신 내가 할아버지께 미음을 가져다드리겠다고 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유생들이 모여 있는 사랑채 대청으로 나오셨다. 여전히 기력이 없었다. 유생들은 할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소리 내어 글을 읽었다.
사람이 지켜나갈 도리에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오륜이 있다.
먼 곳만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글귀에 귀를 기울이셨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섬김을 다하는 것이 부자유친이며,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음이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니 이는 곧 장유유서이며...
이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강의 하듯 말하셨다.
“부자유친이 별 거더냐. 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유서(父子有序)’이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기필코 순서가 지켜져야, 세상 질서가 잡힌단 뜻이다. 죽는 순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부자유친’과 ‘장유유서’를 합쳐 엉뚱한 말을 한 것이다.
유생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고개를 푹 숙였다. 맹자에 나오는 오륜을 뒤죽박죽 만드는 할아버지의 슬픔을 잘 알기에 그저 눈시울만 붉혔다.
‘아, 할아버지!’
나는 아무 말도 해드리지 못했다. 어떤 말도 할아버지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이다. 그저 먹먹한 가슴을 누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싶을 뿐이었다.
스토리테마파크 참고스토리
김택룡, 조성당일기, 1616-10-24 ~ 1617-01-28
늙은 아비,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제문을 읽고 슬피 울다
김택룡, 조성당일기, 1617-04-16
작가소개
- 이 붕

- 동화 <요요>로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아 동화작가가 되었으며 대교눈높이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을 받았다. 주요작품으로 <아빠를 닮고 싶은 날>, <5학년 10반은 달라요>, <비틀거리는 아빠>, <선생님 탐구생활>, <물꼬할머니의 물사랑>, <그래서 행복해>, <반디야 만나서 반가워>, <으뜸 으뜸 왕으뜸>, <우리 엄마는 걱정대장> 등이 있다. (사)어린이문화진흥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 부자간의 정이야 끝이 없지만, 운명을 어쩌랴 - 아들이 끝내 숨을 거두다 ”
“ 늙은 아비,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제문을 읽고 슬피 울다 ”
“ 출가한 딸의 와병 소식에 잠을 설친 아버지 ”
“ 산사에 들어가 공부하는 아들 뒷바라지 - 책과 음식, 그리고 편지를 보내다 ”
“ 둘째 딸의 혼례 준비 - 비용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다 ”
“ 할아버지의 매 - 공부를 게을리 한 손자에게 매를 들다 ”
| 시기 |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 장소 | 출전 |
|---|